
[11월] 포모의 소장자료 소개 '일제에 항거한 조선인 청년들 - 고려독립청년당 -'

일제에 항거한 조선인 청년들
비밀결사단체 '고려독립청년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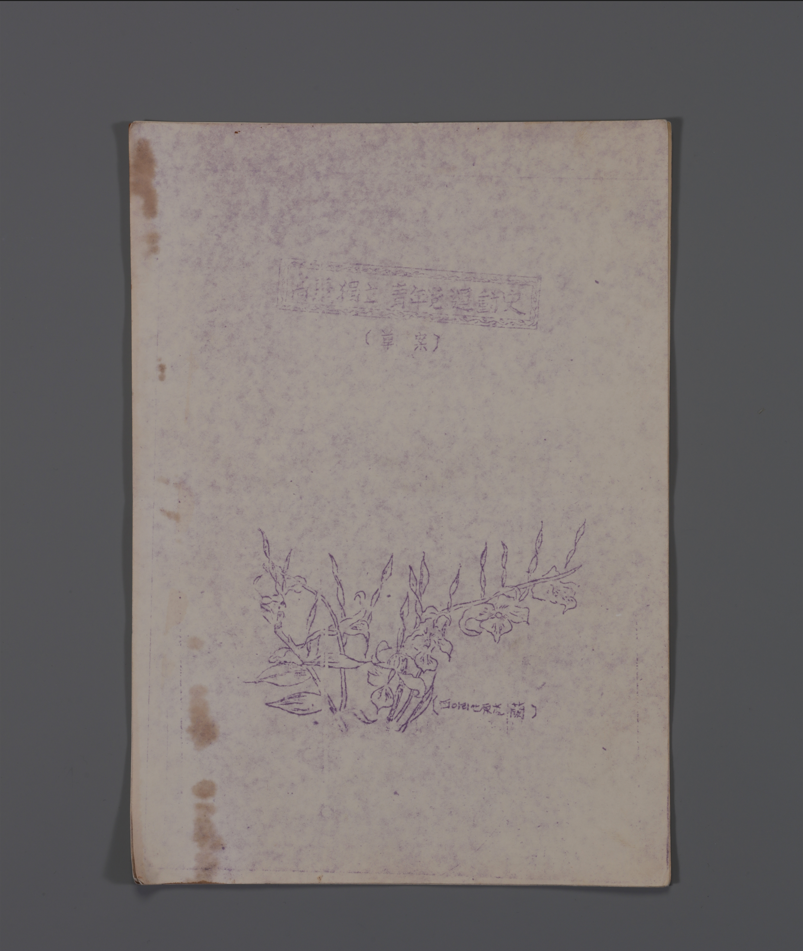
고려독립청년당운동사 초안[역사관 1879]
고려독립청년당高麗獨立靑年黨의 항일투쟁抗日鬪爭 운동의 역사를 적은 초안草案
비밀결사단체 ‘고려독립청년당’의 결성
1944년 6월 일본군이 사이판 탈환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점차 패색이 짙어졌다. 자바 지역에 있던 조선인 군속들은 이런 상황을 틈타 연합군의 자바 진공(進攻)을 대비하여, 연합군 포로와 힘을 합쳐 일본군에 맞서 항일 무장투쟁을 준비하기에 이른다.
같은 해 10월에 태국의 포로수용소에서는 영국군 포로들과 모의해 중국을 향해 탈출을 감행했다가 체포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김주석 사건’이 발발했다. 이것이 촉진제가 되어 인도네시아 자바의 자카르타에서도 비밀 결사 항일 단체가 생겨났다. 이억관의 주도로 조선인 군속 16명이 비밀리에 모여 ‘고려독립청년당’을 결성한 것이다.
‘고려독립청년당’은 10명의 당원으로 창당했지만, 창당 직후 자카르타, 스마랑 지구, 암바라와, 반둥 등 각지에서 가담하면서 26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에는 군속이 아닌 일본 동맹통신 기자(조선인) 1명도 포함되어있다. 이들은 일본군의 조선인 포로감시원 군속이라는 제약 아래, 포로수용소 내부에서 연합군 포로와 연대해서 항일 무장봉기를 일으키고, 외부에서 인도네시아의 반일 세력과 공동 투쟁을 벌일 계획을 꾀하였다.
하지만 전황이 악화되고, 일본군이 잦은 작전 변경을 하게 되면서 신생 고려독립청년당은 항일 투쟁을 준비할 틈도 없이 시련을 맞게 되었다. 일본군이 전쟁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자바의 조선인 군속을 말레이로 전출, 재배치함으로써 고려독립청년당이 창당과 동시에 조직 와해의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자바 최초의 항일 무장투쟁 ‘암바라와 사건’
창당으로 고조된 분위기 속에 전출명령으로 인한 와해의 위기감이 뒤섞여 암바라와 지부에서 항일 무쟁투쟁이 발발했다. 사건은 전출명령을 받은 노병한, 민영학과 함께 이동하던 손양섭 3인이 전송자 운송 트럭을 탈취하면서 시작되었다. 3인은 다시 암바라와로 돌아와 무기고에서 총기를 가지고 나왔다. 탈취한 총기의 첫 표적은 암바라와 분견소장 스즈키 대위였다. 소장을 습격한 후, 관공서를 향해 총기를 난사하고, 암바라와 형무소장과 일본인 군납 어용상인을 잇달아 공격했다.
사건 발생 다음날 손양섭과 노병한은 삼엄한 경계를 뚫고 분견소에서 일본인 통역과 위생병 등 세 명을 살해했다. 일본군은 삽시간에 일본인 피해자가 늘자 암바라와 경찰서에 진압 본부를 설치하고, 인도네시아인 간부후보생 교육대 1개 대대 500여명과 인도네시아인 경방단(警防團)까지 동원해 일대를 겹겹이 포위했다. 고려독립청년당 당원 3인의 무장 항일투쟁은 민영학이 부상으로 사망하고, 약품창고에 은신했던 손양섭과 노병한이 자결하면서 이틀 만에 종결되었다. 무장투쟁으로 인한 일본인 등 사상자는 15명에 달했다.
암바라와 사건은 결과적으로 자바 일본군정 내부의 파열을 의미했다. 게다가 일본군인과 군정에 관여한 일본인을 표적으로 삼아, 정치적·이념적으로 반일 저항운동을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사건 직후에 헌병대가 2차 폭동을 우려해 요주의 조선인 군속을 분산 배치하고, 배후관계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던 것도 일본군정이 암바라와 사건을 전출명령에 불복한 일부 군속의 단순 난동으로 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원들은 암바라와 사건에 이어 스미레호 탈취 계획을 세웠지만, 일본 헌병대가 고려독립청년당의 실체를 포착하면서 검거에 나서게 된다. 총령 이억관을 비롯한 10명의 당원이 ‘고려독립당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기소되었고, ‘치안유지법 제1조’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암바라와 사건으로 사망한 노병한, 민영학, 손양섭 3인에 대해서는 해방 후 1946년 1월 6일 조선인민회에서 위령제를 거행했다.
 KakaoTalk_20241029_114601675_04.jpg
(490KB)
KakaoTalk_20241029_114601675_04.jpg
(490KB)